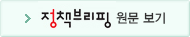다문화자녀 고등교육 취학률 높아져
여성가족부, 「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」 결과 31일 발표
■ 15년 이상 거주자 52.6%, 평균 자녀 연령 12.1세로 최초 10세 진입
■ 다문화자녀 전체 국민과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(NER) 격차('2131.0%p→'2413.0%p)
■ 배우자와의 문화차이('2152.4%→'2448.9%)·갈등('2146.3%→'2445.2%) 경험
■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 비율 65.8%… 통계 작성 이후 최다
□ 여성가족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6,01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'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' 결과를 31일(목) 발표했다.
ㅇ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자녀교육, 사회생활, 경제활동 등 전반을 진단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.
|
|
<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개요 > |
|
|
|
|
|
||
|
·(근거/주기)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4조 / 3년 주기 (국가승인통계 제117079호) ·(조사대상) 42,243 가구 표본 중 16,014 가구 조사 완료
·(조사내용) ①가구현황, ②결혼이민자·귀화자/배우자부부-자녀관계, 자녀양육, 사회생활, 경제활동, ③자녀가정생활, 학교생활, 정서 및 사회생활 등 ·(조사방법) 1:1 면접조사 등 ·(조사기관) 한국여성정책연구원(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), 한국리서치(조사) |
|||
ㅇ 「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」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
□ 조사 결과,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ㅇ 지난 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.9%로, 2021년(40.5%)보다 21.4%p 상승했다. 이에 따라 국민 일반과의 고등교육 취학률 격차도 2021년 31.0%p에서 2024년 13.0%p로 줄었다.
ㅇ 이는 2000년대 초중반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정부의 정책과 지원제도 확대* 효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와 맞물린 결과로 추측된다.
*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정, 다문화 정책 수립, 가족센터 전국 확산 등
□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.
ㅇ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비율이 65.8%로, 2021년(50.8%)에 비해 15.0%p 증가하며,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만~4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은 소득 구간으로 집계됐다.
ㅇ 주택 점유 형태에서는 자가 비율이 56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보증금 있는 월세(20.2%), 전세(19.3%)가 뒤를 이었다.
□ 다문화 가구의 정착 기간이 길어진 것도 특징적이다.
ㅇ 15년 이상 거주자는 52.6%로 2021년 대비 12.7%p 상승하며,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줬다.
< (결혼이민자·귀화자) 국내 거주기간 분포>
(단위: %)
|
구분 |
5년 미만 |
5~10년 미만 |
10~15년 미만 |
15~20년 미만 |
20년 이상 |
|
2021년 |
12.1 |
19.2 |
28.9 |
22.2 |
17.7 |
|
2024년 |
7.4 |
16.6 |
23.4 |
24.3 |
28.3 |
□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.
ㅇ 부부간 문화차이 경험은 48.9%로 2021년(52.4%)에 비해 감소했으며,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이 없다(만5세 이하 26.3%→27.3%, 만6~24세 11.9%→21.8%)는 응답은 상승했다.
ㅇ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긴급돌봄(24.6%), 만 6~24세 자녀의 경우 경제적 비용 부담(24.9%)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.
□ 차별 경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, 그 비율은 13.0%로 2021년(16.3%)보다 감소했다. 다만 차별을 경험한 경우 '참는다'(80.7%)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
□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고용률이 62.7%로 2021년(1.9%p) 대비 상승했고, 월평균 200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율도 지난 조사의 39.6%에서 58.6%로 높아졌다.
ㅇ 다만, 근로 직종으로는 단순노무직이 39.0%를 차지하며 2021년(32.4%)에 비해 증가했다.